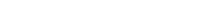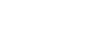- 비주얼1
- 비주얼1
- 비주얼1
Leading sustainable society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우수 연구활동
-

수소화물 기반 환원 반응으로 고성능 전극 구조 제어 기술 제시 서강대학교 연구진이 리튬이온전지 음극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게르마늄(Ge)의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합성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수소화물 기반 복상 환원 반응을 활용해 게르마늄의 미세구조를 조절함으로써 전극 성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게르마늄은 실리콘(Si)보다 우수한 전기·이온 전도 특성을 보여 차세대 고출력 리튬이온전지 음극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부피 변화와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제 전지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기존 합성법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류재건 교수 연구팀(제1 저자: 이기정 석사과정생)은 나트륨 수소화물(NaH)을 환원제로 사용해 산화 게르마늄(GeO₂)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반응 중에 발생하는 수소와 금속 나트륨의 역할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NaH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소는 다공성 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금속 나트륨은 산화물을 효과적으로 환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러한 복상(Multi-phasic) 환원 메커니즘을 통해 나노결정과 비정질 구조가 혼합된 독특한 게르마늄 구조를 구현할 수 있었다 (그림 참조). 이번 연구에서 합성된 게르마늄 전극은 기존 상용 게르마늄 입자 대비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능을 보였다. 특히 반복적인 충·방전 사이클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높은 가역 용량을 나타냈고, 고전류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공성 구조가 체적 팽창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혼성 구조가 전자 및 이온 전달을 동시에 향상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연구의 교신저자인 류재건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금속 산화물의 환원 과정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공 구조와 결정성을 복합적으로 제어한 최초의 접근”이라며, “본 전략은 다양한 금속 산화물 기반 고용량 음극재 합성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아 차세대 고에너지 밀도 활물질 설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성과는 에너지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 Advanced Science (Impact factor: 14.1, JCR 상위 7.1%)에 게재되었으며, 본 연구는 한국재료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게르마늄 산화물의 환원 메커니즘 및 나트륨 수소화물과의 조성비에 따른 합성 결과물(위)과 다공성 저마늄 활물질의 성능 특성(아래) 논문제목: “Unraveling Hydride-Driven Multiphasic Reduction Toward Tunable Germanium Structures for Lithium-Ion Batteries”(공동1저자: 이기정, 강지은 박사, 공동교신저자: 이진우 박사, 류재건 교수)논문링크: https://advanced.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dvs.74278연구실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view/jryugroup/home
-

[연구] 온실가스 메탄, ‘플라즈마’ 만나 휘발유로 변신... 고효율 촉매 기술 개발 [연구] 온실가스 메탄, ‘플라즈마’ 만나 휘발유로 변신... 고효율 촉매 기술 개발 <좌측> 김주찬 박사, <우측> 하경수 지도교수 - 특수 설계된 ‘계층적 다공성 촉매’로 플라즈마 반응 효율 극대화 - 고온·고압 공정 없이 메탄을 가솔린·디젤 등 액체 연료로 직접 전환 - 탄소 침적 문제 해결하며 합성연료(e-Fuel) 상용화 가능성 열어 서강대 하경수 교수팀은, KAIST 이진우 교수팀, 서울대 한정우 교수팀과 공동연구하여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CH4)을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고부가가치 액체 연료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복잡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기존 공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차세대 합성 연료 생산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비열 플라즈마 내 HP-TiO2 및 HP-SiO2의 개략도. (위) 계층적 다공성 촉매는 CH4 활성화를 촉진하며, 플라즈마-고체 계면에서 비중성 경계층인 데바이 쉬스가 형성되어 미세 방전 및 스트리머 형태로 전자를 밀어낸다. (아래) HP-TiO2 및 HP-SiO2의 서로 다른 표면 특성이 CH4 직접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메탄을 탄소 사슬이 긴 탄화수소(C5~C16)로 직접 전환하는 ‘계층적 다공성 이산화티타늄/실리카(HP-TiO2/SiO2) 촉매’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풍부하지만,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어 다른 물질로 변환하기가 까다롭다. 기존에는 메탄을 합성가스로 만든 뒤 고온·고압에서 반응시키는 ‘피셔-트롭쉬(Fischer-Tropsch)’ 공정이 주로 쓰였으나,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열 플라즈마(Non-thermal Plasma)’ 기술과 이에 최적화된 새로운 촉매 구조에 주목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촉매는 고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마치 스펀지처럼 미세한 기공(Mesopore)과 큰 기공(Macropore)이 섞여 있는 ‘계층적 다공성 구조’를 띠고 있다.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플라즈마가 촉매 내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 메탄의 활성화 반응이 획기적으로 촉진된다. 특히 촉매 내 티타늄(Ti)과 실리카(Si)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별도의 고온 개질 과정 없이도 가솔린 및 디젤 범위의 탄화수소를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연구팀은 또한 밀도 범함수 이론(DFT) 계산을 통해 해당 촉매의 내구성도 입증했다. 반응 중 탄소 찌꺼기(Coke)가 쌓여 촉매 성능이 떨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티타늄 촉매가 반응 에너지 장벽을 조절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촉매 반응의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설계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구 관계자는 “이번 기술은 낮은 온도에서도 메탄을 유용한 액체 연료로 직접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향후 합성 연료 및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에너지와 환경 촉매 분야 최고의 권위지인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 and Energy (IF 21.1, JCR ranking 1.2% in Engineering, Environmental)에 출간되었다 (주저자: 서강대 김주찬 박사, KAIST 반민경 박사과정, 포항공대 임현애 박사). 논문서지사항: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 and Energy 386 (2026) 126437 논문 출처: https://doi.org/10.1016/j.apcatb.2026.126437
-

전극 수명과 재활용성을 모두 잡은 차세대 배터리 바인더 설계 실리콘 기반 음극재는 지구 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높은 에너지밀도를 보여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용 음극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 음극재는 충방전 과정 중 큰 부피 변화로 인한 성능 열화로 인해 공유 결합형 또는 가교형 바인더(Binder)를 사용하여 전극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바인더는 전지 구동 후 회수 및 분리가 어려워 전지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류재건 교수 연구팀(제1저자: 권진용 석박통합과정생)은 한국화학연구원(KRICT) 연구진과 협력하여 “이중 동적 상호작용 기반 완전 순환형 재활용 가능 실리콘 음극재용 바인더”를 새롭게 설계하였다. 연구진은 입체장애 우레아(Hindered Urea) 상호작용과 보로닉 에스터(Boronic Ester) 상호작용이 동시에 가능한 바인더를 도입하여 전극 내 가역적 가교형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극의 기계적 물성을 높이며 전극 내부에서 자가 치유가 가능하도록 제어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전지 구동 시 전기화학적 성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전지 구동 이후 간단한 수계 처리를 통해 가교 네트워크가 분해되어 바인더 및 전극 구성 요소 (실리콘 활물질, 도전재, 바인더)가 분리 및 회수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기존의 고온/산 처리 기반 재활용에 대비하여 공정성 및 친환경성이 높으며 회수한 물질의 완전 재활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바인더(C15DDB)를 사용한 전지는 0.5C(2시간 충·방전) 조건에서 250회 사이클링 후에도 초기 용량의 82%를 유지하였으며, 구동 후 회수한 전극 물질을 완전히 재활용하여 제작한 전지 또한 두 번째 재활용까지 안정적인 사이클 수명 특성을 보였다 (그림 참조). 본교 화공생명공학과 류재건 교수는 “이번 연구는 동적 공유결합형 바인더를 활용하여 전지 구동 이후 모든 전극 구성 성분의 분리, 회수 및 재활용을 시도한 최초의 접근”이라며, “이번 연구는 기능성 바인더를 기반으로 전기화학적 성능 향상 및 전극 성분의 재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부여한 사례로, 향후 친환경·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설계에 중요한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성과는 화공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mpact factor: 13.2, JCR 상위 3.0%)에 게재되었으며,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NRF)과 한국화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이중 동적 상호작용 바인더의 작동 및 재활용 메커니즘(위)과 완전 재활용 전지의 성능 특성(아래) 논문제목: “Dual dynamic network architecture toward circular utilization of bulk Si-based anodes for sustainable Li-ion batteries”(공동1저자: 권진용, 유지홍 박사, 공동교신저자: 김진철 박사, 류재건 교수)논문링크: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38589472512514X연구실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view/jryugroup/home
-

물로 구동하는 배터리, 4성분계 수계 전해질로 더 오래-더 안전하게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류재건 교수 연구팀(제1저자: 조연상 석박통합과정생)은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및 서울대학교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계 리튬이온전지의 고전압 구동과 장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Dual-Amide 기반 4성분계(Quaternary) 전해질을 개발하여 에너지 재료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게재되었다. 수계 전해질은 불연성, 비휘발성, 저비용 등의 장점으로 유기 전해질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리튬이온전지용 전해질로 주목받고 있으나 낮은 물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으로 인해 전위창(~1.23V)로 좁고, 고전압 구동 시 수소 발생 반응이 유발되는 본질적 한계를 지닌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형 아세트아마이드(Acetamide)와 환형 카프로락탐(ε-Caprolactam)을 함께 사용한 Dual-Amide 전략을 적용하였다. 두 아마이드의 상호 보완적 특성을 활용해 리튬 이온 주변의 솔베이션 구조를 조절함으로써 물의 반응성을 낮추고, 전극 계면에서 안정적인 LiF 기반 고체 전해질 계면이 형성되도록 유도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AC22 전해질은 LMO||LTO 기반 풀셀 구동 시 1C(1시간 충·방전) 조건에서도 1200회 충·방전 후 82%의 용량을 유지해 우수한 장수명 특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계 리튬이온전지 분야에서 보고된 사례 중 최장수명에 속하며, 수계 전해질의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연구는 수계 전해질의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분자 단위 설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Dual-Amide 전해질은 고안전성 에너지 저장장치(ESS), 친환경 배터리 기술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유기 전해질 대비 화재 위험이 낮아 안전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Dual-Amide 기반 전해질의 용매화구조 변화(위)와 1C 장수명 성능 특성(아래)
-

화공생명공학과 강태욱 교수, 기계공학과 김동철 교수 공동연구팀, 균일하고 계층화된 플라즈모닉 나노센서를 쉽고 확장 가능한 힘 인가 모세관 기반 콜로이드 나노입자 전사 방법 개발 - 화공생명공학과 강태욱 교수, 기계공학과 김동철 교수 공동연구팀,균일하고 계층화된 플라즈모닉 나노센서를 쉽고 확장 가능한 힘 인가 모세관 기반 콜로이드 나노입자 전사 방법 개발- 나노과학분야 국제학술지 ‘Small’ 게재 - 강태욱 교수 연구팀(공동 제1저자: 라주아 연구교수, 황금래 박사후연구원)이 기계공학과 김동철 교수 연구팀(공동 저자: 이현주 박사후연구원)과 펜실베니아 대학교 허동은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 성과로 콜로이드 금속 나노입자를 활용하여, 균일한 3차원 플라즈모닉 구조체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플라즈모닉 센서를 이용한 고감도 분자 검출에 필요한 전기장 증폭 구조를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어, 질병 진단용 진단 플랫폼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인다. 3차원 플라즈모닉 구조체를 제작하는 기존 방법(예, Langmuir-Blodgett deposition)은 층 수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에서의 입자 응집, 층간 비균일성, 표면 전하에 따른 구조적 불안정성과 같은 한계로 인해 균일한 3차원 플라즈모닉 구조체를 형성하기 어려웠다.본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관을 기반으로 낮은 세기의 외력을 이용한 적층 기술을 제안하였다. 물/공기 계면에 형성된 콜로이드 금속 나노입자 단층막을 모세관 내부로 분리한 뒤, 수 pN 수준의 외력을 인가하여 단층막을 기판에 전사했다. 이 방식은 입자 간 에너지 장벽을 극복해 비가역적인 층간 흡착을 유도함으로써 균일한 3차원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제작 방법은 Langmuir-Schaefer 방법으로 제작한 구조체보다 표면 및 라만 신호 균일성이 증가하였으며, 입자 크기, 표면 전하, 조성에 영향, 층 수에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또한, 제작한 구조체를 이용해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분석했을 때, 최대 104배 향상된 민감도를 확인하였다. <그림 1>▲ 개발한 균일하고 계층화된 플라즈모닉 나노센서를 쉽고 확장 가능한 힘 인가 모세관 기반 콜로이드 나노입자 전사 방법 모식도 해당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사업’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세종과학펠로우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분야 상위 국제학술지 ‘Small’(Impact Factor: 12.1, JCR 상위 10% 이내)에 게재되었다. 논문 제목: Facile Scalable Assembly of Uniform and Layered Plasmonic Hotspots by Force-Assisted Capillary-Mediated Colloidal Transfer논문 링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smll.202507365
-

황금래 박사 한국 연구재단 이사장상 수상 황금래 박사가 Fabrication of Plasmonic Nanoparticle Bilayers by Pressure-assisted Pin-Point Capillary Transfer for Sensitive Biomarker Detection의 주제로 GHUB 국제공동연구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한국 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

황금래 박사(지도교수 강태욱) 2025 International GHUB Symposium 'Outstanding Researcher Award' 수상 강태욱 교수 연구팀의 황금래 박사가 2025 International GHUB Symposium에서 Outstanding Researcher Award를 수상했다. 황금래 박사는 서강-UPenn 신종 감염병 테라노스틱스 융합연구센터에서 바이오마커 검출을 위한 플라스몬 나노구조 개발에 기여하는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황금래 박사, 상장과 시상장면]
-

이호준, 성정호 석박통합과정 연구원, 김효정 석사과정 연구원 (지도교수 이종석), 2025년도 한국화학공학회 우수 구두 발표상 및 우수 포스터상 수상 이종석 교수님 연구실의 이호준 (석박통합과정) 연구원이 2025년도 한국화학공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하였다. 발표제목: Selective In-Pore Growth of MOF-808 in Polymeric Fibers for Metal Ion Recovery from Industrial Wastewater 이종석 교수님 연구실의 성정호 (석박통합과정) 연구원이 2025년도 한국화학공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하였다. 발표제목: Tuning Metal-Organic Frameworks with Mixed Ligands for Boosted Ethylene/Ethane Adsorption Separation 이종석 교수님 연구실의 김효정 (석사과정) 연구원이 2025년도 한국화학공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발표제목: ZIF 계면 조절을 통한 고성능 수소 분리막 개발 연구실 홈페이지: http://gsslab.sogang.ac.kr 좌측부터 이호준 연구원, 성정호 연구원, 김효정 연구원, 이종석 교수
-

서강-유펜 융합연구센터 국제공동연구진, 세계 최초 '혈관화된 고형암 CAR-T 치료 예측 체외 플랫폼' 개발, Nature Biotechnology 게재 서강-유펜 융합연구센터 국제공동연구진, 세계 최초 '혈관화된 고형암 CAR-T 치료 예측 체외 플랫폼' 개발, Nature Biotechnology 게재 서강대학교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설립된 서강-유펜 신종감염병 테라노스틱스 융합연구센터(공동연구책임자: 강태욱 교수/서강대, Dan Huh 교수/펜실베니아대)가 인간 고형암 조직을 미세공학적으로 이식하고 혈관화하여 CAR-T 세포치료를 체외에서 모델링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생명과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Nature Biotechnology(Impact Factor: 41.7)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실제 인간의 고형암 조직을 체외에서 혈관을 통해 관류시키며 CAR-T 세포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2차원 세포배양이나 동물실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제 인체 내 상황을 정밀하게 재현한 혁신적 성과입니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한국의 국제공동연구 역량과 첨단 바이오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향후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태욱 센터장(본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은 "본 성과는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서강-유펜 융합연구센터에서 한국의 우수한 나노기술과 미국의 최첨단 생체모사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글로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지원 및 참여 연구진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과제번호: RS-2023-0025934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주요 참여자: 강태욱 교수(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Dan Huh 교수(펜실베니아대학교 Bioengineering) 논문 정보: A tumor-on-a-chip for in vitro study of CAR-T cell immunotherapy in solid tumors<강태욱 센터장> <해외연구기관 책임자 Dan Dongeun Huh 교수>
-

남기진, 이현오, 이우석, 김성민 학생 대학원혁신지원사업 BK21 장학생 선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은 2020년 9월 1일부터 7년간 추진 중인 국가 지원사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기초 및 핵심 학문분야의 연구역량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장학금은 BK21 참여대학원생 또는 교육연구단의 연구·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중 우수한 연구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지닌 학생에게 수여됩니다. 본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네 종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SG Frontier 장학금: BK21 참여대학원생 또는 교육연구단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중 연구역량이 탁월하여 교육연구단 성과에 기여하는 자 2. SG Bridge 장학금: BK21 참여대학원생 또는 교육연구단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중 대학 내·외 강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 3. SG Global S: BK21 참여대학원생 중 학업·연구역량이 탁월하여, 우수한 교육자 및 연구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 4. SG Wings 장학금: BK21 참여대학원생 중 가계곤란으로 학업 및 연구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대학원생 5. SG Rising Star 장학금: BK21 교육연구단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석사연계과정생 중 학사과정 최종학기생으로 다음 학기 본교 대학원 진학 후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예비 대학원생 이번에 우리 학과 “분자제어기반 화공생물공정연구팀(연구팀장 강태욱 교수)”의 - 석박사통합과정의 남기진 (지도교수: 이종석), 이현오 (지도교수: 강문성) 학생은 SG Frontier 장학생(장학금 600만원)으로 - 학석사연계과정의 이우석 (지도교수: 강문성), 김성민 학생 (지도교수: 조현석)은 SG Rising Star 장학생(장학금 100만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수상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연구와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국내외를 선도하는 연구자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교수 소개
-

- 오세용 교수님
(Se-Young Oh) - 광전자 나노소재 및 그린에너지 연구실(Photoelectronic Nanomaterial and Green Energy Lab)
syoh@sogang.ac.kr 02-705-8681 (R509A)
- 오세용 교수님
-

- 최진훈 교수님
(Jinhoon Choi) - 뇌 정보학 연구실(Brainformatics Lab)
choi@sogang.ac.kr 02-705-8917 (R609A)
- 최진훈 교수님
-

- 임종성 교수님
(Jong Sung Lim) - 열물성 연구실 (Thermodynamics Properties Lab)
limjs@sogang.ac.kr 02-705-8918 (R603A)
- 임종성 교수님
-

- 이진원 교수님
(Jinwon Lee) - 생물화학공학 연구실(Bio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jinwonlee@sogang.ac.kr 02-705-8919 (R513A)
- 이진원 교수님
-

- 오병근 교수님
(Byung-Keun Oh) - 나노생명공학 연구실(Nanobiotech Lab)
bkoh@sogang.ac.kr 02-705-8478 (R505A)
- 오병근 교수님
-

- 강태욱 교수님
(Taewook Kang) - 나노플라즈모닉스 연구실(The Nanoplasmonic Research Group)
twkang@sogang.ac.kr 02-705-8920 (R519A)
- 강태욱 교수님
-

- 김현철 교수님
(Hyuncheol Kim) - 기능성 나노의약 연구실 (Functional Nanomedicine Lab)
hyuncheol@sogang.ac.kr 02-705-8922 (R503A)
- 김현철 교수님
-

- 김충익 교수님
(Choongik Kim) - 하이브리드 전자재료 연구실 (Hybrid Electronic Materials Laboratory)
choongik@sogang.ac.kr 02-705-7964 (R605A)
- 김충익 교수님
-

- 하경수 교수님
(Kyoung-Su Ha) - 지속가능 탄소중립 연구실 (Carbon Neutral Laboratory for Sustainability)
philoseus@sogang.ac.kr 02-3274-4892 (R515A)
- 하경수 교수님
-

- 이종석 교수님
(Jong Suk Lee) - 녹색지속가능분리 연구실 (Green & Sustainable Separation Laboratory)
jongslee@sogang.ac.kr 02-705-8496 (R409A)
- 이종석 교수님
-

- 나정걸 교수님
(Jeong Geol Na) - 생물공정 연구실(Bioprocess Engineering Laboratory)
narosu@sogang.ac.kr 02-705-7955(R511)
- 나정걸 교수님
-

- 강문성 교수님
(Moon Sung Kang) - 전자 및 이온소재 연구실 (Electronic & Ionic Materials Engineering Laboratory)
kangms@sogang.ac.kr 02-705-8475(R611A)
- 강문성 교수님
-

- 김형준 교수님
(Hyeong Jun Kim) - 고분자 이온 소재 연구실 (Polymer Ionic Materials Laboratory)
hjunkim@sogang.ac.kr 02-705-8483(CY414)
- 김형준 교수님
-

- 류재건 교수님
(Jaegeon Ryu) - 에너지 저장 소재 및 시스템 연구실 (Battery Energy Engineering Lab)
jryu@sogang.ac.kr 02-705-8482 (R517A)
- 류재건 교수님
-

- 박제영 교수님
(Jeyoung Park) - 지속가능 플라스틱 연구실
jeypark@sogang.ac.kr 02-705-8477 (F705)
- 박제영 교수님
-

- 조현석 교수님
(Cho, Hyun-Seok) - 전기화학공학 연구실
hscho@sogang.ac.kr 02-705-8484 (CY413)
- 조현석 교수님
-

- 신희종 교수님
(Heejong Shin) - 전기화학 에너지 변환 연구실(Electrochemical Energy Conversion Laboratory)
hshin@sogang.ac.kr 02-705-8921 (CY412)
- 신희종 교수님
대학원생 소개
-

- 양지혜 / 2019년 입학(통합과정)
- 양자점 기반의 고해상도 광패터닝 공정 개발과 발광소자 연구
-

- 임종표 /2020년 입학(박사과정)
- 저는 최정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빛 감응성 망막 오가노이드를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김영석 / 2022 입학(석사과정)
- 방사선 저항성 산화물 반도체 연구
-

- 신민규 / 2017년 입학(박사과정)
- 저는 최정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뇌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바이오로봇을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
-

- 황민지 / 2013년 입학(통합과정)
- Develop hydrogel ECM with multiple spatial inhomogen...
-

- 양지우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메탄 전환 전기화학 촉매
-

- 송광호 / 2017년 입학(통합과정)
- Studying hysteresis of hydrogel swelling upon dehydr...
-

- 한동헌 / 2021 입학(석사과정)
- 광가교제를 통한 유기발광체 고해상도패턴 및 발광특성 제어
-

- 이원준 / 2009년 입학(통합과정)
- 저는 최정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한 뇌 질환 제작 및 약물 스크리닝 연구를 수...
-

- Praveen Yadav / 2020년 입학(박사과정)
- I study development of biosensing strategies for det...
-

- 목동현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계산 화학 및 기계 학습
-

- 안주현 / 2021년 입학(통합과정)
- 저는 최정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대뇌 및 중뇌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뇌 어셈블로이드를제작하는 연구...
-

- 안정은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올레핀/파라핀 기체 분리용 다공성 나노입자 및 하이브리드 분리막 개발
-

- 성문숙 / 2018년 입학(박사과정)
- 이산화탄소 분리정제를 위한 고분자 분리막 소재 개발
-

- 박우병 / 2020 입학 (석사과정)
- 저항성 메모리 및 신규 유기반도체 소자 개발
-

- 박시영 / 2021년입학(석사과정)
- 저는 최정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대뇌 및 시상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뇌 어셈블로이드를 제작하는 연...
-

- 이수진 / 2014년 입학(통합과정)
- Mechanical instability of composite hydrogel
-

- 김승한 / 2019년 입학(통합과정)
- 고분자 전기화학 발광소자 및 유연소자용 박막의 기계적 물성 제어
-

- 안희성 / 2017년 입학(박사과정)
- 올레핀/파라핀 기체 분리용 다공성 나노입자 및 하이브리드 분리막 개발
-

- 이우석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계산 화학
-

- 이동민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Reactions in plasma-bed, Fischer-Tropsch synthesis&n...
-

- 윤종일 / 2021년 입학(연계과정)
- 양자점의 표면 제어 및 도핑을 통한 트랜지스터 특성 분석
-

- 조현우 / 2019년 입학(통합과정)
- 양자점의 표면 제어와 전도현상 기반의 트랜지스터 제작 및 분석
-

- 이현오 / 2021 입학(석사과정)
- LED 빛을 이용한 2차전지 충/방전 성능 평가 연구
-

- 이명준 / 2019년 입학(박사과정)
- Microfluidic device, biosensor, nanoparticle
-

- 곽동길 / 2021년 입학 (학석연계)
- 친환경 양자점의 가교를 통해 자발광하는 고성능 QLED 제작
-

- 한은경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Polymer기반의 유전체 약물전달 시스템
-

- 장용호 / 2021년 입학(박사과정)
- LNP 기반의 mRNA 전달체 개발
-

- 문성진 / 2021 입학(석사과정)
- 계산화학 및 기계학습
-

- 김태영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리튬-황 전지 전극 소재
-

- 김혁준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광활성 리간드의 가교 반응을 통한 고해상도 양자점 패터닝
-

- 이승한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유기발광체 초미세 패터닝과 미세패턴의 광전자 특성 제어
-

- 이재현 / 2015년 입학(통합과정)
- 메탄 전환 전기화학 촉매
-

- 유현정 / 2017년 입학(통합과정)
- 천연가스 정제를 위한 무기막 및 탄소분자체 분리막 개발
-

- 김주찬 / 2020년 입학(박사과정)
- Reactions in plasma-bed, Fischer-Tropsch synthesis&n...
-

- 유철훈 / 2019년 입학(통합과정)
- 분리 공정(MF, VF, UF, RO, GS)에 쓰이는 고분자 분리막 개발
-

- 강현우 / 2021 입학 (석사과정)
- 방사선 저항성 산화물 반도체 연구
-

- 조용현 / 2022 입학(석박사통합과정)
- 양자점 고해상도 광패터닝
-

- 호동일 / 2017년 입학 (통합과정)
- 저는 김충익 교수님 연구실에서 금속산화물 반도체의 전기적, 고에너지 스트레스로 인한 성능저하...
-

- 김상준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C1 가스 전환 바이오 촉매 개발 연구
-

- 박준수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리튬-황 전지 전극 소재
-

- 윤승재 / 2021 입학 (석사과정)
- 친환경 유기박막트랜지스터 소자 개발
-

- Chai Hanyu / 2019년 입학(석사과정)
- C1 가스 전환 바이오 촉매 개발 연구
-

- 김종승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계산 화학 및 기계 학습
-

- 김영재 / 2022 입학(석사과정)
- Surface-Enhanced Raman Spectroscopy Study Using Gold...
-

- 육아영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실시간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한 2D 소재의 강유전성 변화 분석
-

- 윤찬규 / 2021 입학(석사과정)
- C1 가스 전환 바이오촉매 개발 연구
-

- 성정호 / 2022 입학(석박사통합과정)
- 올리핀/파라핀 기체 분리용 다공성 나노입자 개질 및 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분리막...
-

- 이호준 / 2020년 입학(통합과정)
- H2O/N2 분리용 다공성유기골격체 및 하이브리드 분리막 개발
-

- 박세영 /2021년입학(연계과정)
- 다양한 가교제를 통한 양자점 광가교 패터닝 및 특성 분석
-

- 정혜원 / 2020 입학 (석사과정)
- 펄스 스트레스 하에서 산화물 소재의 안정성 제어
-

- 임창혁 / 2022 입학(석사과정)
- 양자점의 고해상도 패터닝
-

- 이한결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전기화학 기반의 반도체 나노결정 물성 제어
-

- 심현진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Aromatization
-

- 신정한 / 2021 입학(석박사통합과정)
- 2차전지 폐액 농축-분리용 분리막 기술 개발
-

- 차예림 / 2022 입학(석사과정)
-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활용되는 핵심 원천 소재인 고이온전도성 신소재 합성과 소자 특성 평가&n...
-

- 이민정 / 2020 입학 (석사과정)
- 친환경 용매 기반 유기박막트랜지스터와 인버터 제작
-

- 배기성 / 2019년 입학(통합과정)
- Reactions in plasma-bed
-

- 설지원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메탄 전환 전기화학 촉매
-

- 신정협 / 2019년 입학(석사과정)
- Biosensor using signal enhancing nanoparticles
-

- 최선우 / 2020 입학 (석사과정)
- 방사선 저항성 산화물 반도체 연구
-

- 김재현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리튬-황 전지 전극 소재
-

- 이혜주 / 2021 입학(석박사통합과정)
- 친환경 용매 기반 바이러스 필터 소재 개질 연구
-

- 오인재 / 2017 입학(박사과정)
- Antibody를 이용한 항암제 연구
-

- 전종현 / 2016년 입학(통합과정)
- Aromatization, Fischer-Tropsch synthesis
-

- 류정욱 / 2022 입학(석사과정)
- 생물반응기 미반응 기체 회수용 분리막 대면적화 연구
-

- 이태형 / 2021 입학(석사과정)
- C1 가스 전환 바이오촉매 개발 연구
-

- 이다영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리튬-황 전지 전극 소재
-

- 강동원 / 2014년 입학 (통합과정)
- Glucose fuel cell in hydrogel contact lens
-

- 조휘찬 / 2022 입학(석사과정)
- 앙자점의 표면 제어 및 도핑을 통한 트렌지스터 분석
-

- 권태현 / 2019년 입학 (통합과정)
- 양자점 기반 광전상향전환 근적외선 가시화 소자
-

- 윤지웅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Conversion of C1 gases to bioproducts by using micro...
-

- 김태환 / 2019년 입학(박사과정)
- Conversion of C1 gases to bioproducts by using micro...
-

- 김두환 / 2022 입학(석사과정)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

- 남기진 / 2020년 입학(통합과정)
- 올레핀/파라핀 기체 분리용 다공성 나노입자 및 하이브리드 분리막 개발
-

- 김철호 / 2014년 입학(통합과정)
- 나노구조 음극 소재
-

- 박소윤 / 2021 입학(석사과정)
- 펄스 스트레스 하에서 산화물 반도체의 특성 분석 및 안정성 제어
-

- 정현동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계산 화학 및 기계 학습
-

- 이은비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polyplex 기반의 유전체 약물전달시스템
-

- 유현지 / 2013년 입학(통합과정)
- Develop in vitro model of blood vessel and its patho...
-

- 차승희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Fischer-Tropsch synthesis
-

- 장호연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계산 화학 및 기계 학습
-

- 이종익 / 2019년 입학(통합과정)
- 이온성 액체 기반의 전기화학 반응 분석, 평가 및 소자 연구
-

- 양정모 / 2014년 입학(통합과정)
- C1 가스 전환 바이오 촉매 개발 연구
-

- 이민경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리튬-황 전지 전극 소재
-

- 최은진 / 2020 입학 (석사과정)
- 저항성 메모리 및 신규 유기반도체 소자 개발
-

- 김현빈 / 2021년 입학(연계과정)
- 근적외선 발광 소재 기반의 QLED 제작
-

- 정건희 / 2022 입학(석사과정)
- 이온성 액체를 활용한 전기화학발광소자 제작 및 분석
-

- 홍진주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Aromatization
-

- 김기원 / 2016년 입학(통합과정)
- 차세대 에너지 저장 소자
-

- 김희원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Fischer-Tropsch synthesis
-

- 최서영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C1 가스 전환 바이오 촉매 개발 연구
-

- 송지애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Biosensor for multiplexed detection of toxins
-

- 김영중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ZIF-8 - Dual Enzyme Reusable Nanocage
-

- 신주호 / 2020년 입학(박사과정)
- 다공성 탄소 소재를 이용한 Cx 가스 회수 및 분리정제
-

- 오의림 / 2021 입학(박사과정)
- 단백질 의약품 생산용 미생물 배양 최적화, mRNA
-

- 오경연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corneal neovascularization treatment through anti-VE...
-

- 조영흔 / 2021년 입학(박사과정)
- 멜리틴기반의 나노입자 개발
-
- 이세리 /2020년 입학(통합과정)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Perovskite Solar Cell)
-

- 윤지수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리튬-황 전지 전극 소재
-

- HanLu / 2021 입학(석사과정)
- C1 가스 전환 바이오촉매 개발 연구
-

- 임상은 / 2021년 입학(석사과정)
- C1 가스 전환 바이오 촉매 개발 연구
-

- 정세민 / 2020년 입학(석사과정)
- 다공성 나노세공체 기반 독성화학물질 방호용 흡착소재 개발
-

- 하태형 / 2017년 입학(박사과정)
- 저는 최정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신경근 접합부 형성 및 근육 운동 제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김도연 / 2019년 입학(박사과정)
- 질 표면개질을 통한 나노 약물전달 시스템 개발 및 항암/항염증 연구
-

- 이용철 / 2020 입학 (석사과정)
- 친환경 용매 첨가를 이용한 유기전자소자의 성능 향상 및 신규 유기반도체 소자 개발
-

- 이채현 / 2022 입학(석사과정)
- 계산화학 및 기계학습